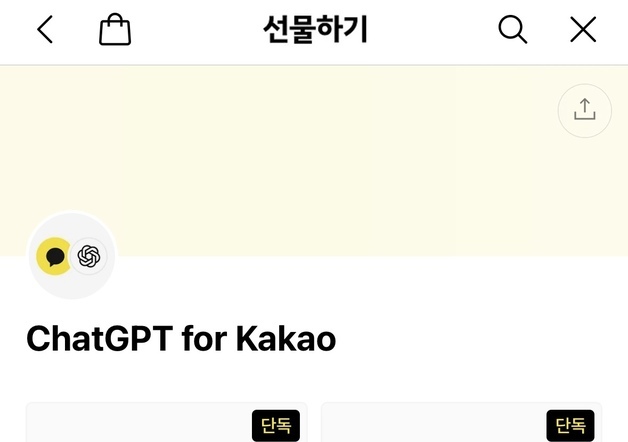국힘 벌써부터 고개 드는 지선 책임론…승패 기준 두고 신경전 가열
친한계 "지선 후 위기 올 것"…잇따른 친한계 징계로 갈등 심화
지선 앞 '특수론' vs '결과론'…결과 책임론에 내홍 전초전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승패의 기준'을 두고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라는 초유의 위기 국면을 거친 후 치르는 지선인 만큼 특수 상황을 감안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과 그 자체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공방은 지선 후의 격렬한 내홍의 전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잇따라 제명한 데 이어 설 연휴 직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친한계는 잇따른 징계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장 대표를 향한 책임론 공세의 시점을 지선 직후로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이대로 지선을 치를 경우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지도부가 버티기 힘들다는 계산에서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는 지선 이후를 겨냥해 지도부를 저격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토크콘서트에서 "선거는 결과 책임이니 저는 지난 총선에서 지고 나서 바로 사퇴했다"며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지고 나서 지도부에서 사퇴를 안 하면 안 되냐는 정당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친한계 의원도 "장 대표의 강경 일변도 기조에 대한 우려가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책임론으로 뒤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전 노선 전환을 꾸준히 요구한 소장파 의원들 역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쌓일 만큼 쌓인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선 체제로 전환하는 상황인 데다, 자칫 현 시점에 당 지도부와 대대적인 충돌을 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역공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친한계와 소장파도 전면적인 공세는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권파 내에서는 지선 승리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는 반론이 나온다. 대선 패배 1년 만인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책임의 크기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권파 사이에서 주로 언급되는 선거는 지난 2018년 지선이다. 당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부 패배했다. 텃밭인 부산과 경남에서도 민주당에 승리를 내줬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당시 당색을 지우기 위해 무소속 신분으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당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보면 이번 선거와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가 가장 강했던 직전 대선 때를 거론한다. 당시에도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대구, 경북을 포함해 부산, 울산, 경남, 강원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을 단순 합산해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보다 높았던 서울, 대전, 충북, 충남도 가시권 내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승패 기준을 두고 이견이 큰 만큼 당내에서는 지선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선이 국민의힘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장 대표가 자신의 강경 노선의 경쟁력을 증명할지, 또다시 권력 투쟁의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지 지선 결과에 따라 달렸다"고 전망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