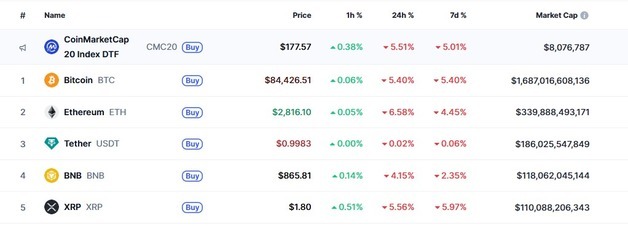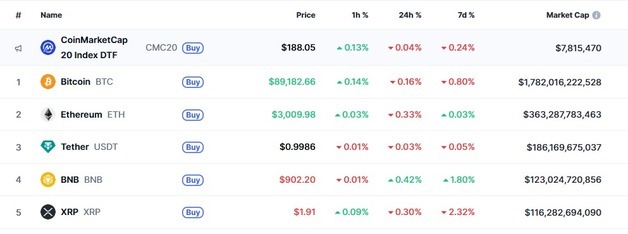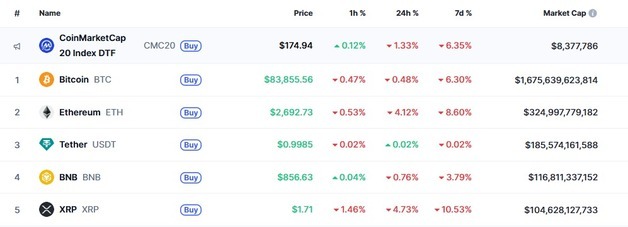[기자의 눈] 단합의 이름으로 키운 분열…장동혁 대표의 역설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강조해 온 말이다. 거대 여당과 맞서야 하는 소수 야당으로서 절박함의 호소이자, 이제 내부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뭉치자고 외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내 반발은 거세졌고 갈등은 오히 깊어졌다.
돌이켜보면 장 대표가 외친 '단합'이 과연 설득의 언어였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상 정치권에서 이런 호소가 진정한 힘을 얻으려면, 물밑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선행되거나 이견이 당내로 녹아들 공간을 열어줘 왔다. 그러나 장 대표가 외치는 단합에는 이같은 조율이나 이견 수렴의 과정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잇따른다.
그러다 보니 장 대표의 외침은 그저 절망한 지지층의 분노가 향할 대상을 지목하는 일에 더 가까웠다. 비극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이었다. '내부 총질자', '배신자'에 대한 적개심을 동력 삼아 당권을 거머쥔 장 대표가 도달한 결론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었다.
국민의힘 내 반(反)한동훈파 의원들조차 당혹스러운 선택이었다. 현상 유지와 제명 사이에 다양한 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를 고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한 전 대표는 이미 정치적 위기에 내몰려 있어 현상 유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한동안 입지를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 전 대표에게는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서사를, 친한(친한동훈)계에는 강력한 '집단 반발의 명분'을 쥐여준 꼴이 됐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에 대해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의 독립적 판단이었다며 책임을 비껴가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기구들을 꾸린 것도 장 대표였고, 최고위 의결은 장 대표의 손을 거쳤다. 단합보단 분노한 지지층의 환호를 의식한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장 대표가 고른 해법의 결과는 당내 분열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당의 유력 인사인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소장파·친한계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당은 그 어느 때보다 원심력이 커졌고,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결국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했음에도 가장 자극적인 해법을 택함으로써, 장 대표는 당내 갈등을 관리하는 리더가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당사자가 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뼈아픈 것은 이같은 분열 심화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대한 견제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권은 통일교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여러 악재에 휩싸여 있어 야당이 화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지만, 집안 싸움에 이를 놓치고 있다.
장 대표가 지목한 '내부의 적'은 이제 당에서 사라진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무리한 제명으로 내부가 분열되고 대여 투쟁력이 심각하게 약화한 제1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 대표는 직시해야 한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