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과 제주 바람의 상생…제주 ᄇᆞᄅᆞᆷ이 만든 문화
[제주어가게로 보는 제주] ⑤ 보롬왓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서귀포 중산간, 오름 군락이 병풍처럼 감싸 안은 10만 평 대지에는 제주어로 '바람 부는 밭'이라는 뜻의 'ᄇᆞᄅᆞᆷ왓'(보롬왓)이 있다.
계절마다 튤립, 수국, 맨드라미 등 형형색색의 꽃이 피는 체험농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보롬왓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메밀 축제'를 연 곳이다.
이종인 보롬왓 대표를 비롯한 청년 농부 4명은 2010년 이곳을 매입해 메밀 농사를 시작했다. 워낙 강한 바람에 농부들도 마다하던 그야말로 황무지였다.
이 대표는 "메밀도 심을 수 없는 곳이었던 밭을 5년간 일궈 2015년 메밀축제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며 "흔한 이름을 대신할 축제 명칭을 고민하다 제주어를 사용해 '보롬왓'으로 짓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입구에 뜻을 써두니 사람들이 '아, 여기는 바람이 센 곳이구나'하며 아무리 바람이 강해도 웃으면서 간다"며 "바람이라는 단점이 제주어 덕에 장점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밀 축제를 시작한 건 '메밀 최대 생산지' 제주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당시만 해도 제주가 메밀 최대 생산지라는 걸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비록 우리는 유명한 소설은 없지만, 보롬왓이라는 제주어로 한 번 알려보자 하는 마음이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꽤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장애물 같았던 '바람'과의 상생을 택하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밀신화'가 전해 내려오는 제주만의 메밀 문화를 알리는 선봉장에 서게 된 셈이다.
방언학자 김순자 박사(전 제주학연구센터장)는 "제주는 모든 게 바람과 연결이 된다는 말이 있듯 바람은 자연재해를 몰고 오기도 하지만 제주인들은 바람에 적응하는 생활양식과 문화를 만들어 왔다"며 "보롬왓도 과거 궁핍의 상징이기도 했던 메밀을 문화의 영역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말마따나 바람의 섬 제주에서는 재앙과도 같았던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곧 문화유산이 됐다.
바람 그물로도 불리는 돌담이 대표적이다. 얼핏 보면 그물처럼 곳곳에 구멍이 뚫려 약해 보이지만, 돌담은 태풍이 몰아쳐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구멍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 풍압을 덜 받아서다.
밭 주위를 현무암으로 쌓아 올려 만든 제주 밭담은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2014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현재 949동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초가는 바람을 견디기 위한 건축 기술의 집약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08년 펴낸 '제주문화상징'에는 "초가의 모습은 거친 자연환경에서 배양된 주민의 기질을 관통하는 표징"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기도 하다.
겨울이면 제주 마을 곳곳을 붉게 수놓는 동백나무도 알고 보면 바람에 대항하기 위한 방패막이였다. 150년 전 제주의 강한 바람이 집어삼키던 황무지를 울창한 동백 방풍림으로 일군 고(故) 현맹춘 할머니의 위미 동백나무 군락이 좋은 예다.
이렇게 바람과의 상생을 택한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은 오늘날 제주만의 문화유산으로, 또 제주를 찾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김 박사는 "제주 바람은 강요배 화백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듯 예술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풍력발전을 통해 바람이 경제 자원화되고 있다"며 "보롬왓처럼 '바람'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곳은 제주가 바람의 고장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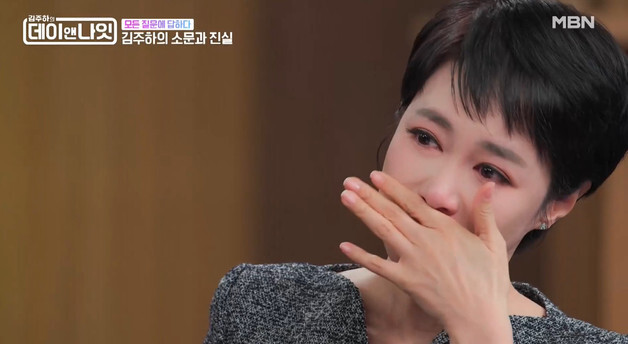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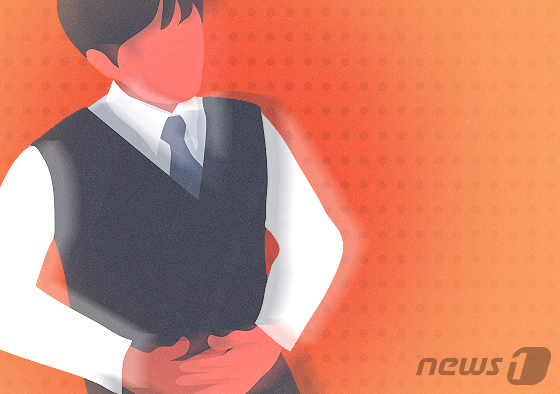



편집자주 ...뉴스1은 도내 상점 간판과 상호를 통해 제주어의 의미를 짚어보고, 제주어의 가치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기획을 매주 1회 12차례 보도한다. 이번 기획기사와 기사에 쓰인 제주어 상호는 뉴스1 제주본부 제주어 선정위원(허영선 시인, 김순자 전 제주학연구센터장, 배영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들의 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