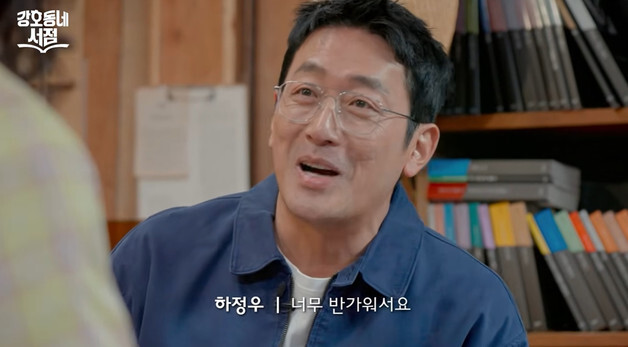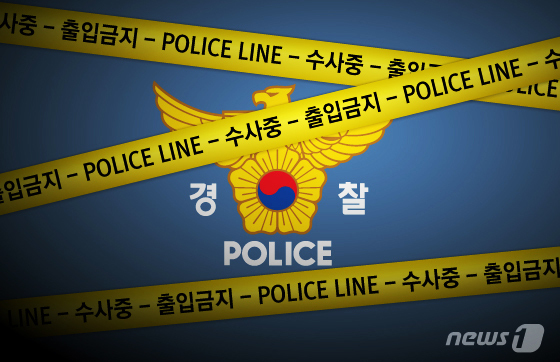"보험금 노려" vs "졸음 사고"…진도 저수지 살인 무기수 재심 종결
피고인 사망 '궐석 재판'…검찰 '고의 살인' 무기징역 구형
박준영 변호사 "선입견이 몰아간 교통사고" 무죄 주장
- 최성국 기자
(해남=뉴스1) 최성국 기자 =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재심 전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한 '궐석 재판'이 41개월 만에 종결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이 사건이 '불화를 겪던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거듭 구형했다.
사망한 피고인을 대리해 궐석 재판을 이어온 박준영 변호사는 '졸음 운전 사망사고'가 수사기관의 선입견에 의해 살인 사건으로 오판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故) 장 모 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절차를 27차 공판을 끝으로 종결했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장 씨가 몰던 1톤 트럭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장 씨 아내 A 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장 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9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장 씨는 대법원을 거쳐 지난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며 지난 2022년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핵심 쟁점은 '사고의 고의성'이다. 검찰은 '계획 살인'을 주장했다.
검사는 재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인 아내 앞으로 다수의 생명 상해 보험을 가입했다"며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해 해지 위기에 처하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화물차를 추락시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 한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가슴엔 압박흔이 남아 있다. 비록 피고인이 사망했지만 비슷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섣부른 선입견이 중첩돼 '졸음 교통사고'가 살인사건으로 오판됐다고 맞섰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감기약을 먹었는데 피해자의 몸에선 수면제 성분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법 감정 전문가들의 판단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피해자 몸에서 나온 방어흔은 119구조대의 심폐소생술의 결과"라며 "당시 국과수 법공학자도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의 논리적 비약을 재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장 씨와 아내 관계가 좋았다는 것은 증인신문에서 밝혀졌다. 장 씨가 살인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홀로 탈출하기 위해 미리 차 앞유리창을 뜯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아내의 안전벨트를 다시 착용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수 가입 보험'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1997년 이들 가족의 주택이 전소된 화재, 피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 목적'을 의심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피고인이 서민이니까, 잘 살지 못하니까, 남들이 20만 원씩 2개만 가입하면 됐던 보험을 1만 원짜리로 여러 개 들었던 것"이라며 "소방이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 낸 화재와 장애 판정을 얻은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다수 가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가입 보험 대부분이 납입금을 환급받는 저축성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자가 피해자로 된 보험도 다수였다"며 "살인 선입견을 준 보험설계사는 당시 수사 경찰의 아내였다. 이 사건은 선입견에서 시작해 살인으로 결론지어진 '오판'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심 재판부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