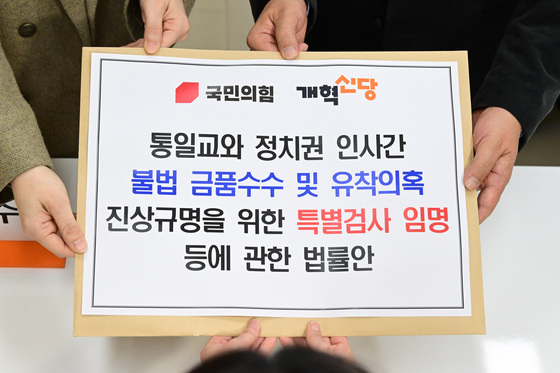[김편의 오디오파일] 빈 무지크페라인에서 쇼스타코비치를 듣다

(오스트리아 빈=뉴스1) 김편 오디오칼럼니스트 = 필자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를 해봤다. 바로 오스트리아 빈의 무지크페라인(Musikverein)에서 클래식 공연을 보는 것이었다. 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가 매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바로 그곳. 오디오파일이자 음악애호가로서 필자에게 무지크페라인은 어쩌면 반드시 가봐야 할 운명 같은 것이었다.
무지크페라인은 1870년 1월6일 2개 공연장을 갖춘 채 개관했다. 하나는 황금색 화려한 내부 장식 때문에 ‘황금홀’이라 불리는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Grosser Saal)이고, 다른 하나는 1937년부터 ‘브람스홀’이라 불리는 600석 규모의 ‘소공연장’(Kleine Saal)이다. 이후 2004년 증축해서 4개 홀이 더 생겼다.
공연은 5월17일 오후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주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 악단은 빈 교향악단(Wiener Symphoniker), 지휘자는 만프레드 호네크(Manfred Honeck), 피아노 연주자는 러시아의 이고르 레빗(Igor Levit). 만프레드 호네크 지휘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었지만 빈 심포니나 이고르 레빗은 꽤 자주 접한 편이었다.
지금까지 황금빛으로 칠해진 내부 공연장 사진만 봐온 탓이었을까, 아니면 빈 시내 건물들이 워낙 화려하고 잘 지어졌기 때문이었을까. 환한 저녁에 도착해 본 무지크페라인 건물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수수하다’였다. 야경이 훨씬 멋있었다. 어쨌든, 디지털 파일로 받은 입장권을 보여준 후 자리잡은 곳은 황금홀 26열 3번 좌석. 객석 뒤쪽 오른편이었다.
황금홀 내부는 더할나위 없이 화려했고 음향학적으로 세세하게 설계된 듯했다. 건축가 테오필 한젠(Theophil Hansen)이 설계한 이 황금홀은 길이 48.80m, 폭 19.10mm, 높이 17.75m를 보인다. 직접 안에서 살펴보니 5층 높이에 달하는 높은 천장을 빼놓고는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비교적 작은 공연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크기와 덩치가 다가 아닌 법이다. 무지크페라인, 그 중에서도 이 황금홀이 보스톤심포니홀 등을 제치고 지휘자들이 선정한 가장 뛰어난 연주홀로 자리잡은 것은 음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갖가지 내부 장식 덕분이다. 전면의 대형 파이프 오르간과 올록하고 볼록한 벽면 디자인, 대리석과 목재로 이뤄진 다양한 벽면 재료, 그리고 그 벽면에 아로새겨진 갖가지 장식과 문양 등등.
또한 양 측면을 둘러싼 수십개의 실물사이즈 여신상을 비롯해, 안쪽으로 1.5m쯤 돌출된 2층 양측면과 후면 객석 발코니, 그리고 1층 양측면 객석 칸막이를 덮고 있는 백여장의 두툼한 양탄자 모두가 ‘황금홀 사운드’의 일등공신들이었다. 심지어 천장에서 내려와 내부를 환하게 밝히는 제법 큰 크기의 여러 샹들리에까지 ‘최고의 음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이 시작됐다. 황금홀 사운드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누긋하고 편안했다는 것. 나쁘게 말하면 기대에 못미쳤다. 워낙 고해상도 음원과 칼 같은 분해능을 가진 소스기기로 오디오를 즐겨온 탓에 황금홀에서 울려퍼진 베토벤 피협 ‘황제’는 이상하리만치 먹먹하고 음들 하나하나가 약간씩 뭉개진 것처럼 들렸다. 일단 오디오적 쾌감이 느껴질 만한 ‘최소 음량’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필자의 자리가 워낙 뒤쪽이고, 이날 공연장이 만석인 탓이 컸다. 중간 인터미션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 와인을 마시고 담소를 나눌 때, 앞쪽에서 들어본 일부 연주자들의 악기 연습소리는 귀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다. 아,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앞쪽 ‘상석’에 앉았어야 했다! 그리고, 역시 최대의 음향 흡음재는 ‘사람’인 것이다.
이에 비해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는 오른손과 왼손 연주음이 또렷이 구분될 만큼 섬세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들려줬고, 오케스트라 각 악기는 좌우 앞뒤 위아래 구분이 확연해 만족스러웠다. 빈 교향악단은 이날 제1 바이올린군과 제2 바이올린군을 좌우로 벌려놓고 가운데에 첼로군, 그 위쪽에 관악, 목관, 그리고 그 위에 더블베이스를 올려놓은 전형적인 유럽식 오케스트라 배치였는데, 눈을 감고 들어도 이 악기들의 이미지가 정확히 잡힐 듯했다.
또하나 만족스러웠던 것은 황금홀의 풍성한 잔향감. 흔히 말하는 ‘홀톤’이 입에 침이 고일 만큼 풍윤하고 맛깔스럽게 필자의 귀와 머리와 가슴을 간지럽혔다. 이 맛에 잘 지어진 콘서트홀을 가는 것이리라. 또한 위에서 음량이 불만스러웠다고 썼지만 총주 파트에서만큼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귀가 아프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들린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 ‘실연의 음’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오디오 혹은 하이엔드 오디오들이 애써 구사해온 그 연주 현장의 공기감과 깊이감, 공간감이 ‘저절로’ 재현되는 바로 그 현장이었다.
쇼스타코비치의 5번 교향곡이 시작됐다. 앞서 오케스트라 악기 배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심벌즈 연주자가 새로 가세했으며, 더블베이스 연주자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팀파니 위치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왔다. 맞다. 쇼스타코비치 5번은 최소 이 정도 준비는 해줘야 한다. 대신에 이전 곡의 협주를 위해 무대 정중앙 맨 앞에 있던 피아노는 왼쪽으로 비켜났다.
사실 쇼스타코비치 5번 교향곡은 필자의 최애곡 중 하나다. 이 곡은 구소련에 저항하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일종의 정신적 타협으로 작곡, 1937년 11월21일 소비에트혁명 20주년 기념일에 초연됐다. 필자의 애장 CD인 안드리스 넬슨스, 보스톤심포니오케스트라의 도이치 그라모폰 앨범 제목이 ‘쇼스타코비치, 스탈린의 그늘 밑에서’(Shostakovich Under Stalin’s Shadow)인 이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곡은 눈물날 만큼 감동적이었다. 음량 자체가 확연히 늘어났고 음과 음 사이의 적막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바이올린의 여리디 여린 음, 클라리넷의 청명하디 청명한 음은 홀 곳곳을 돌아다니다 필자의 가슴팍에까지 도달했다. 총주는 짜릿했고 대음량이지만 불쾌한 구석은 전혀 없었다. 2악장의 대표 테마도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의외로 감탄한 것은 제3악장. 제2 바이올린군의 독주로 시작된 이 악장은 피아니시모 연주와 섬세한 표현력에서만큼은 실연 현장이 갑 중의 갑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줬다. 쇼스타코비치 5번 3악장이 이렇게 표현과 표정이 풍부했나 싶다. 이밖에 피콜로와 플루트가 일궈내는 디테일한 사운드 역시 그야말로 ‘극강’이라 할 만했다.
마침내 4악장. 필자가 오디오 테스트용으로 지금까지 안드리스 넬슨 음원으로만 백번 이상은 들었던 악장이다. 역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넓은 시베리아에 우뚝 솟은 침엽수림처럼 강건한 음들이 난무한다. 갑자기 음압이 솟구치고 악기들의 광채가 그 순도를 더한다. 그리고 작렬하는 심벌즈와 팀파니의 연타. 이 4악장을 지배했던 팀파니의 강력한 다이내믹스와 강철같은 템포감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
굿 사운드, 굿 플레이. 2018년 5월 무지크페라인의 밤은 이렇게 저물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