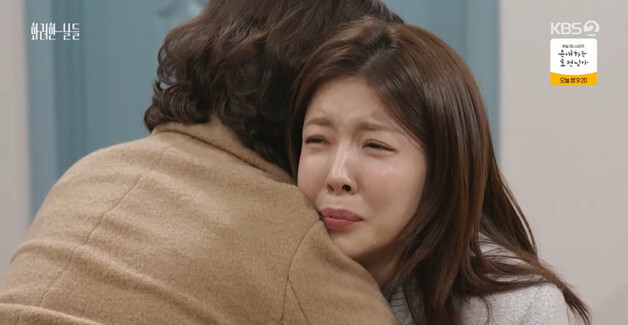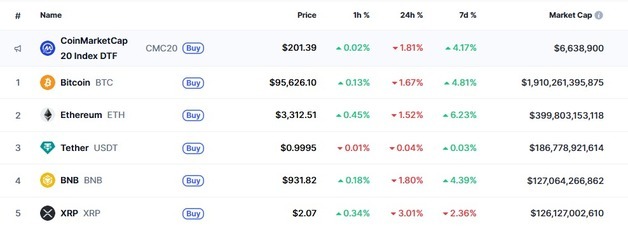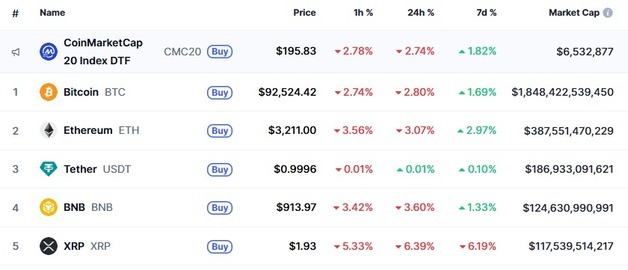정치적 단식과 의료 개입의 경계…"탈수·전해질 이상부터 시작"
단식 초기엔 글리코겐 사용…일주일 넘기면 저혈당·산증 위험
단식은 개인 선택, 치료는 의료 영역…"보험 적용 여부 논의해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치권에서 단식이 이어질 때마다 의료 현장에는 조용한 긴장이 감돈다. 단식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위지만, 일정 시점을 넘기면 탈수, 전해질 이상, 혈압 저하 등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19일 "단식이 며칠까지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물을 섭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체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탈수이며, 탈수가 진행되면 혈압 저하와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단식 초기에는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가 먼저 사용된다.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 포도당이 소모되며, 이 에너지원은 보통 2~3일 이내 대부분 고갈된다.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대사 경로가 전환된다. 김 교수는 "이후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케톤체가 만들어진다"며 "케톤체가 축적되면 혈액이 산성화되는 '대사성 산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는 구역, 구토, 호흡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상적인 활동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저혈당, 저혈압, 탈수, 전해질 이상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단식 초기 3~4일 동안은 혈당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혈당 저하와 전해질 불균형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단식에 대한 의료 개입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지침에서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단식을 강제로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단식 중 탈수나 전해질 이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수액 공급, 전해질 교정 등의 대증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식은 개인이 선택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는 외상이나 자발적 위험 행위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