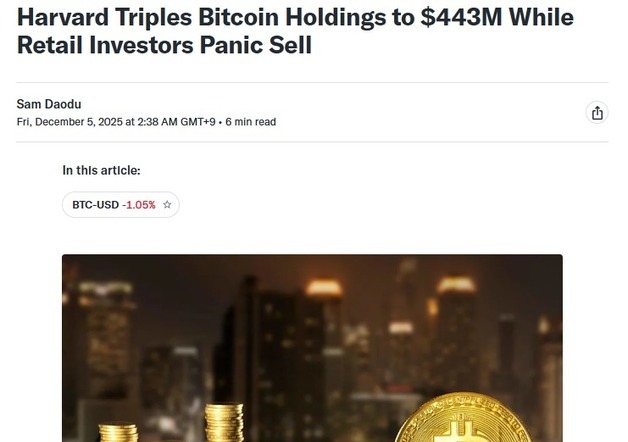추울수록 찾게 되는 무의 비밀 [전호제의 먹거리 이야기]
전호제 셰프
추운 겨울 집으로 돌아와 간편하게 옷을 갈아입다 보면 내 몸과 옷 사이에는 온기가 가득 들어 있음을 느낀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이 이런 따뜻함을 주는 것이리라. 먹거리가 풍부한 요즘엔 그 소중함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
내가 군 생활을 하던 90년대는 아직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때는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야채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을 위해 땅을 파고 무를 저장했다. 어느 날 선임하사의 소집 아래 목장갑을 끼고 취사장 옆 땅을 팠다. 그 아래 큰 플라스틱 통을 넣고 무를 묻었다. 취사병 동기에게 물어보니 봄에 꺼내 쓸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자주 나오던 섞박지와 각종 국물 요리에 쓰였을 것 같다.
무를 저장하는 건 김장이 끝나고 이듬해 봄에 신선하게 먹기 위함이다. 따뜻한 봄이 되면 김장김치는 쉬어지고 거의 다 떨어진다. 바로 이때쯤 땅속에 묻어 둔 무를 꺼낸다. 땅속에서 겨울 냉해를 피한 무는 갓 뽑은 것과같이 싱싱했다고 한다. 푹 쉬어버린 김장김치 대신 저장무로 산뜻한 깍두기를 만드는 것이다.
1978~82년만 해도 1인당 무 소비량은 31㎏이었다. 2018년에는 21㎏ 정도이니 갈수록 감소 추세다. 식구가 줄어든 가구에서 무를 직접 소비하긴 어렵다. 하지만 소비량은 줄어도 무를 대체하는 야채도 마땅하지 않다. 이는 우리 식단의 구성 때문이다.
푹 익어 뜨거운 생선조림에 뭉근한 무조림이라든가 소고기 국물에 몽글몽글해진 무는 매력적인 밥도둑이다. 갈치조림집에 가면 잘 익은 무로 밥 한 끼를 뚝딱 먹을 수 있다. 무김치도 따뜻한 뚝배기에 밥을 말아 먹을 때 빠져선 안 되는 반찬이다.
이렇게 공통으로 무는 각종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던 우리 식단에 곁들여 먹었다. 무 안에는 전분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아밀라제가 들어 있어 천연의 소화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익숙한 재료인 무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지만 가끔 요리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특별한 무 요리법은 일본 프렌치 쉐프님이 보여주셨다. 무를 동그랗게 잘라 물에 푹 익힌다. 거위 간인 푸아그라를 팬에 올려 센불에 굽는다. 여기에 오랜 시간 오리뼈를 우려 조려낸 소스를 만드는데, 약간의 간장으로 향을 더한다. 무 위에 구운 푸아그라를 올려내고 오리뼈 소스를 충분히 뿌려준다. 무와 푸아그라의 부드러움에 녹진한 오리 소스를 먹는 고급진 무 요리였다.
부드럽게 졸인 무는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으로 좋아하는 식감이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국물 없이 무를 강한 불에 익히기도 한다. 우리가 빨간 무라고 하는 래디시(Radish)는 겉은 붉고 안은 하얗다. 그대로 먹으면 작고 아삭한 한입 무였다. 이런 무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오일에 볶는다. 샬럿을 잘게 썰어 향을 내기도 한다. 오븐이 있으면 그대로 구워낸다. 물이 없이 익히니 무 자체의 단맛이 진해진다. 우리 무와는 달리 물컹해지지 않는다.
빨간 무라고 불리는 비트는 오븐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구워준다. 젓가락으로 찔러 익은 정도를 확인한다. 이후 어느 정도 식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이 자체로 단맛이 있어 뜨거울 때 먹어도 좋다. 비트를 썰어 약간의 화이트와인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곁들이기도 한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먹지 않는 나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는 다양한 음식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겨울이 길었던 우리나라에서 땅에 묻어두고 기나긴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중요한 양식이기도 했다.
치킨이나 파스타를 먹어도 빠지지 않는 무피클을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건강을 지켜주던 야채라는 생각이 든다. 온난한 겨울이지만 한두 번씩 매서운 바람이 불어온다. 두툼한 옷과 함께 건강 비타민 무도 자주 챙겨 드시길 바란다.
opini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