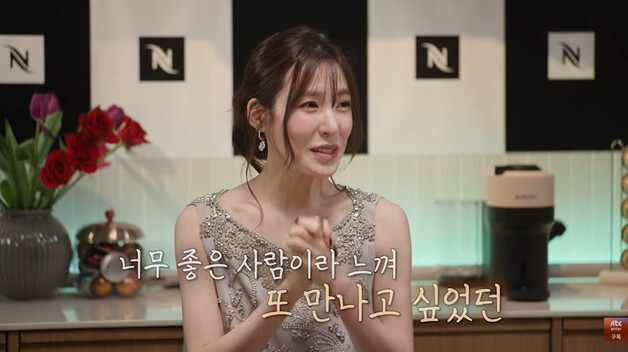밥상 위에서 시작한다…청소년 위한 철학 수업
[신간] '먹는 것도 철학이 되나요'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이지애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가 일상의 질문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힘을 기르는 법을 담아낸 '먹는 것도 철학이 되나요'를 펴냈다.
책은 "오늘은 뭘 먹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먹는 행위'야말로 세계를 이해하는 첫 관문이라 말한다. 밥상 위의 질문이 사고력과 논술력, 나아가 자기 주도적 사고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것.
저자는 철학자들이 남긴 이론을 암기하는 대신, 청소년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에 뒀다.
책은 총 3부로 짜였다. 1부 '음식은 물질이다'에서는 맛이라는 감각의 본질을 탐구한다. 사람마다 맛의 기준이 다른 이유, 몸에 좋은 음식과 입에 좋은 음식이 왜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철학적으로 해석한다.
저자는 '맛의 이데아'를 이야기하며, 플라톤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다. "초딩 입맛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는 장에서는 보편적 미각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지, 감각의 상대성은 무엇인지 토론하게 한다.
이어지는 '식탐은 영혼의 방해꾼!'에서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인용해 '먹는 즐거움'의 한계와 균형을 이야기한다. 에피쿠로스의 식탁은 사치가 아닌 절제의 상징이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음이 진짜 쾌락"이라 말하며, 절제된 행복을 추구했다.
2부 '음식은 문화다'는 우리가 함께 먹는 밥상에 담긴 공동체의 철학을 다룬다. 한국인의 ‘밥심’ 문화에서 출발해, 밥상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사회적 장임을 밝힌다.
저자는 할머니의 밥상이 왜 유독 따뜻하게 기억되는지, ‘같이 먹는 밥’이 왜 유대의 상징인지를 설명하며 "문제는 밥이 아니라 함께"라는 문장을 남긴다. ‘소울푸드’ 장에서는 한국인의 떡볶이를 비롯해 각 문화권의 대표 음식이 어떻게 ‘정체성’이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또 ‘단식 투쟁’이나 ‘금식’ 같은 행위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표현임을 짚는다. 먹지 않음조차 하나의 철학적 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3부 '음식은 윤리이며 예술이다'는 식생활의 윤리와 미래를 탐구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지구를 아프게 한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환경 파괴와 음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인류의 미식 욕망이 생태계를 병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이 입맛을 강제하기 전에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책 전반에는 ‘철학자의 식탁’ 코너가 배치돼 있다. 에피쿠로스, 임마누엘 칸트, 장폴 사르트르의 식습관을 통해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생활로 드러났는지를 흥미롭게 보여 준다.
에피쿠로스는 간소한 식사 속에서 쾌락의 본질을 찾았고, 칸트는 세 시간짜리 점심 식사에서 인간적 교류의 의미를 탐색했다. 사르트르는 "가장 인공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며 음식과 존재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철학이 삶의 언어가 되는 순간이다.
△ 먹는 것도 철학이 되나요/ 이지애 지음·아소코민 그림/ 동아엠앤비/ 1만 4800원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