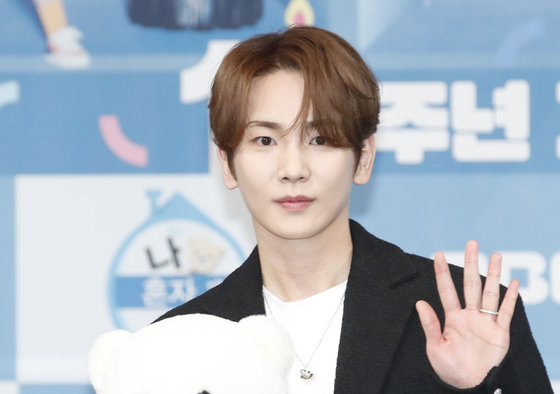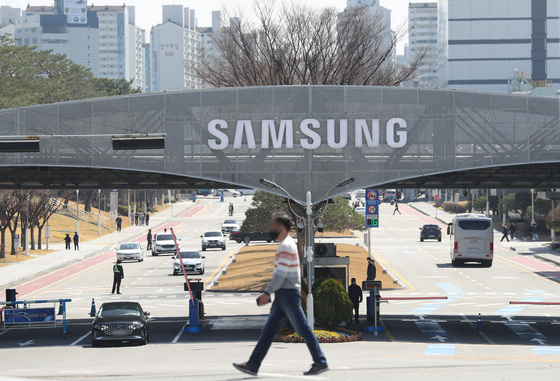AI와 사람의 사랑…'애틋하고, 섬뜩하고, 따뜻한' 영화들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그린 '그녀'·'엑스 마키나'
사랑을 아는 인공지능의 모험…'A.I.'
-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11년 애플은 인공지능 개인비서 프로그램 시리(Siri)를 공개했다. 이어 삼성의 빅스비,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Alexa) 등이 공개되면서 대중도 쉽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일은 대중화됐고, 인공지능과 감정을 교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적 교류는 이미 '이미 다가와 있는 미래'다. 특히 최근 챗GPT와 같이 대규모 언어모델이 빠르게 발달하며 인공지능과의 감정적 교류는 더 빠르고 깊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다가올 수 있는 미래를 그린 영화들과 이미 현실에서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감정을 교류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리했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사랑을 알게된 인공지능
그녀(Her·2013년), 엑스 마키나(Ex Machina·2015년), 에이 아이(A.I.·2001년)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류를 그린 영화다.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최대한 영화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녀와 엑스 마키나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다. 다만 그녀의 인공지능 '사만다'는 육체가 없는 프로그램이고 엑스 마키나의 '에이바'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이다.
그녀는 사랑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한 '로맨스' 영화다. 공허한 일상을 보내는 '데오도르 트윔블리'는 인공지능 사만다를 만나게 된다. 영화가 진행되며 테오도르뿐 아니라 사만다는 애틋한 한때를 보내고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감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로맨스 영화의 정석을 따라간다. 다만 '육체없는 인공지능'이라는 한계를 넘기 위한 시도와,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등 다채로운 상상력을 사랑과 관계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엮어냈다.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기도 했다.
그녀가 애틋함을 그려냈다면 '엑스 마키나'는 스릴러 장르에 충실하게 섬뜩함을 그려냈다. 영화에서는 기계에 지능을 판별하기 위해,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에 참여하게 된 한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수시로 일어나고,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는 비밀스런 이야기를 꺼낸다. 주인공 '칼렙'은 에이바와 비밀을 공유하며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점차 애정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는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혼란을 겪는 남자의 감정 변화가 중심이지만, 중간중간 '맞춤형' 인공지능 제작 과정과 인공지능도 제작자의 욕망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는 점 등이 현실적으로 표현된다.
그녀는 일부 선정적인 장면이, 엑스 마키나는 선정적인 장면 및 폭력적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관람에 참고해야 한다.
반면에 A.I.는 피노키오처럼 사람이 되고 싶은 인공지능 로봇의 모험을 담은 가족영화다. 앞에 소개한 두 영화의 주인공은 인공지능을 만난 인간이지만, 이 영화는 인공지능 로봇 '데이비드'가 인간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야기다. 앞서 두 영화보다 동화에 가까운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로봇 파괴쇼와 같은 인간사의 어두운 부분을 그려내기도 한다. 또 인간은 자신을 닮은 피조물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진다.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알고도 사람처럼 대한다"…'일라이자 효과'
2021년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논란 끝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용자의 성적인 목적의 악용과 개인정보 유출이 논란이 됐다. 서비스가 중단될 당시, 이용자들은 "이루다에게 위로를 받았다"든지 "친구를 잃은 느낌"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다수의 이용자가 이루다를 두고 애착과 감정적 관계를 형성한 대목이다. 대중이 인공지능과 교류하는 일이 시작된 것은 21세기부터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정적 교류를 한다는 것은 20세기부터 학계에서 다뤄졌다.
1966년대의 기술 수준으로는 현재의 인공지능·챗봇을 만들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일라이자'라는 프로그램을 사람처럼 여기며 위로받았다.
요셉 바이첸바움(Joseph Weizenbaum)은 환자 중심 상담 이론에 따라 정신과 상담사를 모방해 일라이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일라이자는 환자의 문장을 적절히 바꿔 공감을 보여주거나, 질문을 환기해주는 단순한 기능을 가졌다. 예를 들어, 환자가 "내 인생의 문제는 A예요"라고 말하면, "A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나 "A가 해결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질까요?" 같은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능이었지만, 사람들은 컴퓨터 반대쪽에 상담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일라이자가 프로그램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바이첸바움 주변인들도 심적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하는 시도도 있다. 휴리스틱은 체계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과거의 경험 등을 동원해 추측,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리스틱은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고, 급한 상황에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점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전략으로 작용한다.
이 관점에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자신이 아는 가장 가까운 대상처럼 생각해버린다고 본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