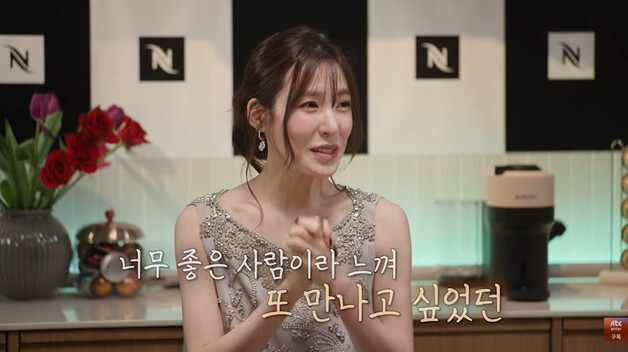10조 AI 예산, 책상머리 아닌 ‘실전 사령부’에 맡겨야[혁신의 창]

(서울=뉴스1) 김현철 (사)한국인공지능협회장 = 2026년 정부가 ‘AI 전환’을 내걸고 편성한 AI 관련 예산은 10조 1000억 원으로, 1년 새 세 배 가까이 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디지털 투자다. 그러나 정작 최전선의 엔지니어들은 환호보다 깊은 우려를 먼저 내놓는다. 낡은 수도관에 수압만 높인다고 물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듯, 시대착오적인 R&D 제도 위에 10조 원을 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넘어 독 자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그 돈을 움직이는 ‘심사-집행-검증’의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여전히 제안서의 두께와 심사위원의 인맥에 시스템을 맡겨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 기술은 화려한 종이 묶음의 뒤편으로 밀려난다. 이제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미션 지향 R&D체계를 받아들이되, 이를 한국적 현실에 맞게 ‘실전형 R&D 체계’로 재구축해낼 때다.
현행 심사위원 풀(Pool)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은 ‘전문성의 역설’이다. 진짜 실력 있는 현업의 전문가들은 1분 1초가 아쉬워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감내하며 지방을 오갈 여유가 없다.
결국 급박한 호출에 응할 수 있는 이들은 현업의 치열함에서 한발 물러나 있거나, 최신 기술 트렌드보다는 평가 행정에 익숙한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 프로세스 자체가 ‘진짜 선수’를 배제하고, 현장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비전문적 결정은 필연적으로 무책임을 낳는다. 수십억 원의 향방을 결정하지만, 과제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평가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과 전문성 없는 평가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된다.
반면 DARPA의 혁신은 ‘책임’에서 나온다. 그들은 PM(Program Manager, 총괄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가혹할 만큼의 책임을 묻는다. PM은 기획부터 선정은 물론, 성과가 부진할 경우 언제든 연구비를 끊고 팀을 해체할 수 있는 ‘Go/No-Go’ 권한을 갖는다.
물론 한국 현실에서 한 명의 ‘슈퍼맨’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공정성 시비 등 위험 요소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도입해야 할 한국형 모델은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닌 ‘검증된 집단 지성’에 기반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매일 기술과 씨름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즉 전문 기업과 연구 조직의 연합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현장을 아는 ‘야전 사령부’가 기획하고 검증하며 그 결과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때, 비로소 눈먼 돈 잔치가 아닌 진짜 R&D가 시작될 수 있다.
평가 방식 또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R&D 선정 과정은 흡사 ‘제안서 디자인 경연대회’ 같다. 화려한 그래픽과 유려한 문장으로 포장된 제안서가 투박하지만 알찬 기술을 압도한다. 선정된 기업이 막상 과제를 수행할 때 모델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이유다.
DARPA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2004년 자율주행 그랜드 챌린지 당시 그들의 질문은 단 하나였다. “모하비 사막 240km를 완주할 수 있는가?” 제안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멈추면 탈락이었다. 우리도 이제 ‘블라인드 코드 챌린지’를 기본값으로 삼아야 한다. 실제 데이터를 주고 불량률을 낮추거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말과 문서가 아니라 ‘작동하는 실력’이 기준이 될 때, 정부 지원금만 노리는 ‘무늬만 AI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률 99%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정부 과제의 높은 성공률은 한국 기술력이 세계 최고여서가 아니다. 감사가 두려워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과제만 뽑거나, 실패한 결과물도 서류 조작을 통해 성공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이다. 혁신은 ‘성공이 보장된 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99%의 성공률은 역설적으로 ‘혁신이 없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AI는 승자독식의 시장이다. 어설픈 기술 100개보다 압도적인 기술 하나가 국가의 GDP를 견인한다. 2026년을 앞두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관(官) 주도의 무작위 심사를 끝내고, 민(民) 주도의 실전형 검증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기술 생태계의 체질을 ‘종이 중심’에서 ‘실전 중심’으로 환골탈태하자는 절박한 제언이다.
제안서가 AI를 만드는가, 아니면 코드가 AI를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에 대한민국 AI의 향후 10년이 달려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뉴스1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sth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