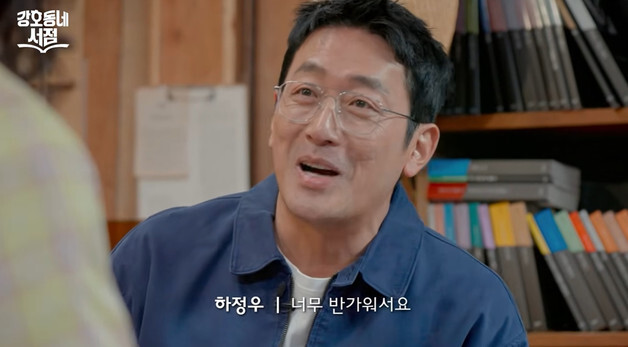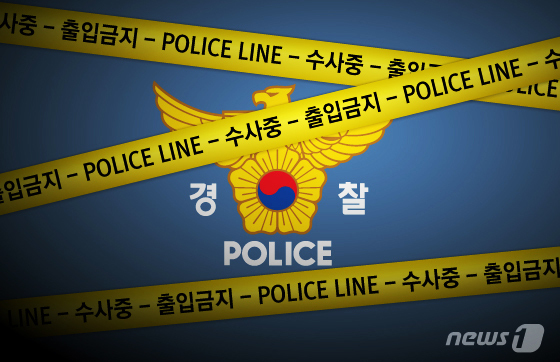[기자의눈]자사주를 제멋대로 굴리는 中小 상장사들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한 달에 걸쳐 취재한 '자사주 쌓아둔 中企' 기획 기사 10편을 최근 마무리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중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톱 100 기업을 분류한 선행 기사가 이번 기획 기사의 출발점이 됐다.
상장사들의 자사주 보유율을 뜯어본 건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였다. 재계에서 엄청난 반대와 함께 내세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라는 것이 자사주 소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자사주 보유율 톱 100 기업' 목록을 받은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돈이 많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100개 기업 중 84%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중 1위 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 원대의 중소기업 인포바인(115310)이다. 자사주 보유율이 기획 작성 당시 54.18%에 달했다. 총발행주식의 절반 이상이 자사주로 묶여있다.
뉴스1이 이 회사의 자사주에 대한 계획을 묻기 위해 공시서류에 공개된 IR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결은 거의 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해 제대로 된 답변은 한번도 듣지 못했다.
다만 회사는 앞선 공시에서 자사주에 대해 '소각을 전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만 공지했다.
기자라는 직함을 공개하고 회사에 연락을 취해도 이 정도인데, 인포바인 소액주주는 회사와 과연 소통이 되겠나 싶었다.
2위부터 10위 기업들도 자사주 비율 30%는 거뜬히 넘겼고 40%를 넘는 곳도 허다했다. 자사주 뿐만 아니라 오너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치면 실제 시장 유통물량은 10% 대에 그치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공시 책임자가 제대로 된 회사의 입장을 전해준 경우는 드물었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주를 이렇게나 많이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뒤따라왔다. 이들의 자사주 취득·처분·소각 내역이 담긴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니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주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 취재한 상위 10개 중소·중견기업 중 많은 회사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유통 주식 물량의 상당수를 자사주로 쥔 상태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한 회사는 최대 주주가 보유한 또 다른 회사에 자사주를 매각해 오히려 최대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주 가치를 희석한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교환사채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활용법이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자사주는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었다. 자사주 소각을 약속한 기업은 10곳 중 단 2곳뿐이었다.
2년 반 가까이 중소·중견기업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은 바닥부터 기업을 일궜거나 선대로부터 가업을 승계했기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이다. 책임 경영이라는 장점도 있기에 마냥 비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적어도 자사주 활용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자사주를 쓰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이제 500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코스피 상승 랠리에 중소·중견기업이 전향적으로 나서준다면 코스피·코스닥의 재평가도 불가능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leej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