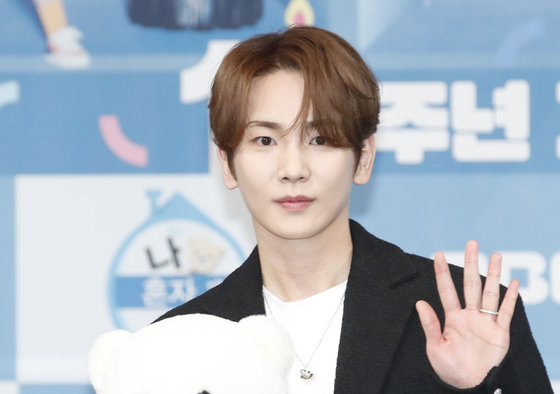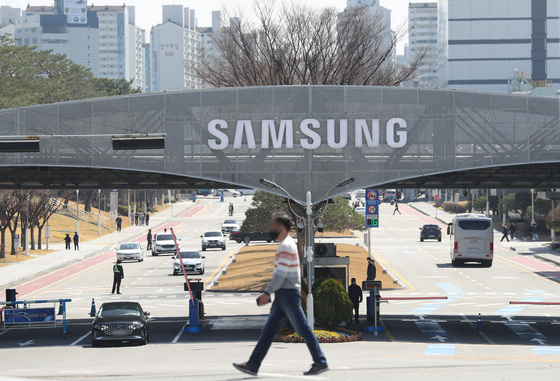한국 위스키 글로벌 진출 막는 '주정 규정'…업계 "제도 정비 시급"
주정 80%여도 한국에선 '위스키'…소비자 혼란·수출 경쟁력 약화
업계 "명칭 제한·표시 의무화가 K-위스키 성장 초석"
-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위스키 업계가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정을 섞은 술도 '위스키'로 분류돼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고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태동기에 접어든 한국 위스키 시장은 제도 개선의 적기를 맞았다. 시작부터 명칭 제한·표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주정'이다. 주류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혼합용 알코올로 위스키 원액보다 10배 이상 저렴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위스키 원액에 주정을 섞어도 전체 알코올 함량의 80%를 넘지 않으면 위스키로 인정된다.
1971년 제정된 대통령령 '주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규정으로, 당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면서 오늘날 소비자 권리 보장과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스키 원액 100%를 사용한 국산 제품의 품질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서다.
인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도 위스키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다. 시장조사기관 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191억 6000만 달러 규모에서 2030년 486억 5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도 위스키는 '가짜' 취급을 받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는 전통적인 곡물 원액이 아닌 사탕수수(당밀) 기반 주정 90% 이상으로 만든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위스키 강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조 격인 영국(스코틀랜드)은 주정을 단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도 2021년부터 위스키 정의를 엄격히 손봐 주정 혼합 술은 위스키로 분류하지 않고 원료주 함량 기준과 라벨 표시를 강화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1970년대 기준에 머물러 국제적 신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알 권리 차원의 문제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사실상 구별할 방법이 없다"며 "알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위스키 하이볼을 먹을 경우 어떤 술이 들었는지 모르니, 누구는 같은 돈을 내고 싸구려 주정을 먹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해결책으로 △주정 혼합 제품을 '기타주류'로 분류해 명칭을 제한하고 △원료주 비율을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추가로 혼합 비율·숙성 정보 등 핵심 정보를 표기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산 위스키 신뢰도를 높여 수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정을 탄 술을 위스키로 인정하면 해외에서는 '가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K-위스키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hisriv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