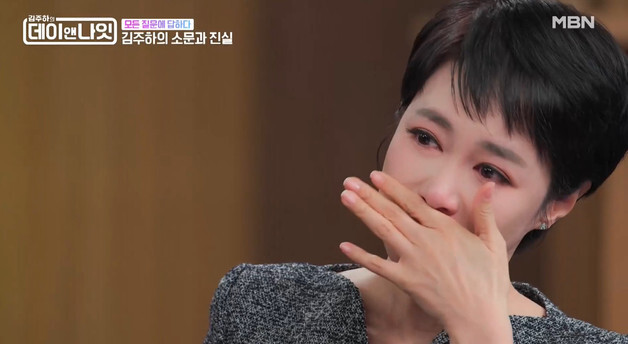어선원 안전보건, '운'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기고]
최수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실 부장
우리는 스마트폰이 건강을 미리 체크하고, 육지의 도로와 공장은 AI가 사고를 예견하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시선을 바다로 돌리는 순간, 시계바늘은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망망대해 위 흔들리는 갑판은 여전히 '디지털의 사각지대'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3000건의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가 65% 이상을 차지하며 사고 원인은 선박의 엔진 성능보다 선원 개인의 컨디션과 직감에 의해 좌우되는 '운항 과실'이 압도적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체 산업 평균보다 사망만인율이 10배 이상 높은 이 위험한 현장에서, 고령의 선원과 낯선 이국땅에서 온 선원들이 오직 '감(Feel)’이라는 불확실한 나침반 하나에 의존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육지가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할 때, 바다는 여전히 선장과 선원의 경험과 직관, 즉 '운(Luck)'에 생사를 맡기고 있다.
안전 패러다임은 이미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측'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지속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POSCO)는 AI 로봇기술을 통해 작업자가 1600℃가 넘는 쇳물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던 작업을 자동화했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를 76%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사고 발생 후 기록하는 '죽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해 흐르는 '산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어선원 안전보건체계의 디지털화 역시 이 지점을 향해야 한다.
하지만 바다는 육지와 다르다. 60세 이상 선원이 56%가 넘는 고령화된 현장, 흔들리는 배 위에서 복잡한 스마트 장비를 다루거나 두꺼운 매뉴얼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뛰어난 첨단 기술도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면 그저 짐일 뿐이다.
이러한 난제 앞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구축한 '카카오 챗봇 기반 위험성평가 플랫폼'은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접근성의 문턱을 극단적으로 낮춘 것'에 있다.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안전 점검을 수행한다. 과거 종이 점검표로 40분 이상 걸리던 행정 작업이 10분 내외의 터치 몇 번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소통과 참여의 확장’이다.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현장의 외국인 선원 비율은 50%를 초과했다. 그동안 언어의 장벽으로 의사소통 한계를 겪었고, 불통은 안전의 위협이 됐다. 선장이 "위험하다"고 외쳐도, 선원이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KOMSA의 플랫폼은 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실시간 다국어 번역 기능을 탑재해 이 장벽을 허물었다. 이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다. 약 2만 8000명의 외국인 선원들을 안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과정이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안전'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연결될 때, 어선에서의 안전망은 비로소 촘촘해진다.
KOMSA는 이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선박별, 시기별로 쌓인 빅데이터는 향후 인공지능과 결합해 "이 선박에서 이런 작업 공정에서는 이런 위험요인을 조심하라"고 먼저 알려주는 '맞춤형 예보관'으로 진화할 것이다. 기존에 파편화돼 사라지던 기록들이 모여, 사고를 미리 막아내는 거대한 ‘디지털 방파제’가 되는 셈이다.
물론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 명문화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 과제는 남아 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어선원 안전의 미래는 경험이라는 낡은 닻을 올리고, 데이터라는 정밀한 디지털 등대를 켜는 데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다. 만선(滿船)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아버지가, 모든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확실한 귀환을 위해, 지금 바다 위에는 데이터가 흘러야 한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