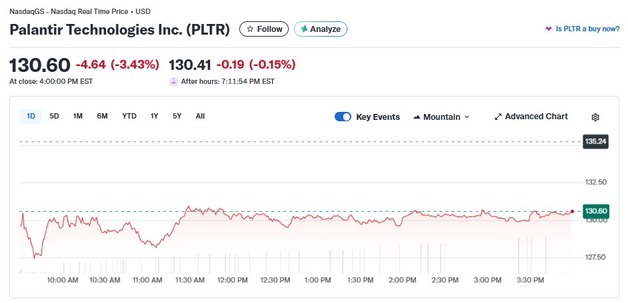'군 안의 군'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무소불위 권력의 그늘
신군부 권력 장악 막후 역할 수행…민간인 사찰 등 '정치개입' 꼬리표
文정부 때 축소됐다 尹정부 때 부활했으나…계엄 연루로 역사의 뒤안길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안의 군'이라고 불렸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 등 군 정보 수집 기능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 등 정치 개입 논란을 야기하며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방첩사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거나 폐지되며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방첩사는 1977년 창설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를 모태로 한 기관으로, 1950년 특무 무대로 시작해 육·해·공 3군에 있던 보안부대를 1977년 통합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방첩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정기 보고를 올리는 등 신군부 권력 장악의 막후 역할을 하며 핵심 기능을 수행했으며, 1979년 10·26 사건 이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하며 야당 인사 등 군 외부 문제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하지만 이후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의 파문이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노동·종교 등 1300여명에 이르는 사찰 명단이 폭로되자 보안사는 정치 개입 근절을 약속하며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다만 이는 기존 기능 등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형식적 개편에 그쳤다.
여전히 대통령의 주요 수족으로서 군림하던 기무사는 2009년 민간인 사찰에 따른 국가 배상,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동향 수집, 2017년 댓글공작 사건 등으로 꾸준히 논란을 빚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계엄 문건' 의혹이 확산하면서 또다시 개편 요구가 거세졌다.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군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 개혁을 시행했다. 인원을 감축하고 정치개입 및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당시 정부는 '해체에 준하는 개편'이라며 정부는 '해편'(解編)으로 표현했다.
안보지원사로 바뀌면서 기무사는 육·해·공군에서 파견된 4200명의 소속 인원 전부를 원소속 부대로 돌려보냈고,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을 중심으로 부대를 재편성했다. 다만 이때도 업무 기능은 기존 기무사와 유사하되, 수사권이 축소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무사의 부활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부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 과정에서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로 다시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의 수족으로 정치인 등 주요 인물의 체포조 명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등 방첩사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축소 재편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을 시사했다.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등 주요 기능을 각각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되, 인사 등 세평 수집 권한은 폐지하는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첩사 업무를 이관받은 세 기관은 '안보수사협의체'를 통해 협업하게 되며, 이들 업무를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도록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이 신설된다. 이들 기관에 대한 감찰은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이 시행하며, 국회에 정기적인 업무보고 시행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 위원회 감시를 통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는 분과위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한 뒤 2026년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