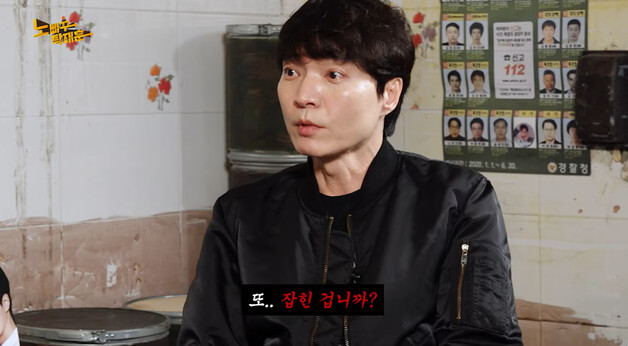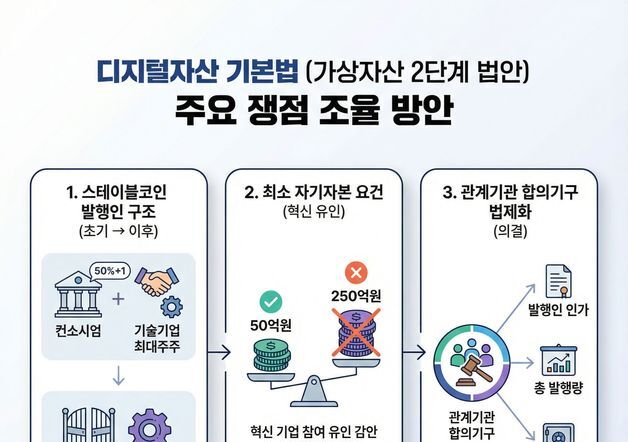北·대만·남중국해 등 넓어진 전장…주한미군 감축 현실화될까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마무리 단계…'전략적 유연성' 확대
"순환배치 등 영향으로 상시 주둔 병력 수는 줄어들 가능성"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관측만 무성했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시작된 미 국방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올 여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GPR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 정부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각 지역에 주둔 또는 파견 중인 미군을 감축 및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련한 주독미군 감축계획은 올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일단 백지화됐지만, 작년 2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합의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국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됐다. 시기만 올 5월에서 8월로 미뤘을 뿐이다.
미 정부는 아시아·유럽 동맹국의 미군 주둔과 아프간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백악관 안보팀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 전 세계 미군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한 군사력 전개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을 감안할 때 "주한·주일미군의 즉각적인 감축은 없더라도 그 역할이나 임무엔 일정 수준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대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5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 당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긴급 상황을 지원하고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역외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동·남중국해 등 해양 진출 확대를 꾀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이 유사시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등지에까지 파견될 수 있단 얘기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고공정찰기 U-2S '드래건레이디'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한반도 상공뿐만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날아가 대(對)중국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달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관한 조항이 빠진 것 또한 이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하는 기류가 새 NDAA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 결정을 막기 위해 2019회계연도 NDAA에선 주한미군 병력 수를 2만2000명, 그리고 2022~21회계연도 NDAA에선 2만85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다고 규정했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도 '순환배치'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는 미군 병력 수는 2만2000~3000명 수준 정도"란 이유로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주한미군을 사실상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6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한 바 없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는 입장을 내놨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