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맹(全盲) 장애인 마라토너 정운로씨(50)와 그를 돕는 동반주자 조성수씨(30)가 남산을 달리고 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
"저희 따라오지 마세요! 천천히 오세요!"전맹(全盲) 장애인 마라토너 정운로씨(50)와 그를 돕는 동반주자 조성수씨(30)가 겨울 아침 남산을 달린다. 동행 취재를 온 기자가 함께 달리겠다 하니 이들이 만류한다.
선천적으로 눈이 좋지 않았다는 정씨는 12세 때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하지만 그는 1㎞를 4분 만에 돌파한다. 정상 시력을 가진 성인 남성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기자는 5분도 채 안 돼 이들을 놓쳐버리고 산 아래에서 쉬었다. 정씨는 입구부터 꼭대기까지를 왕복으로 달리고도 아쉬운지 한 번 더 달리기 시작했다.
정씨와 동반주자 조씨는 끈으로 서로의 팔을 묶고 달린다. 조씨는 정씨가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코스를 안내한다. 조씨는 "형님(정씨) 체력에 맞추려면 너무 힘들다"며 웃었다.지난 2일 '달리기'를 매개로 4년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을 만나 사연을 들었다.
◇20살 차이 극복한 '달리기' 듀오…"믿음이 비결"
정씨와 조씨가 달리기로 인연을 맺은 지 만 4년이 훌쩍 넘었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정씨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살뜰히 챙긴다. 이들은 함께 4년을 달려온 비결로 "서로를 잘 믿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씨는 2016년 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들을 보게 되면서 동반주자 봉사를 시작했다. 조씨는 "그때 처음 만난 운로 형님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매주 남산에 왔다"고 했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봉사'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나온다"며 "나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니 성취감이 배가 되더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저 때문에 형님이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절 잘 믿어주셔서 이제는 편하게 뛴다"며 "형님 성격이 친근감 있으시고 저에게 잘해주시니까 4년 동안 한 것"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조씨가 "하지만 제가 주의하지 못해 형님이 넘어진 적이 있다"고 미안해하자 정씨는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며 조씨를 감쌌다.
정씨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유도선수 출신이다. 학창 시절부터 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한 덕분에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했다.
하지만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5년 만에 몸무게가 20㎏이나 불었다. 2000년 정씨는 다시 운동을 결심했다. 그가 택한 것은 달리기였다. 정씨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해보니 승부욕이 생기더라"고 했다.
처음에는 일반 마라톤 동호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VMK)라는 동호회를 결성했다. 조씨도 이곳 소속이다.
정씨는 "처음에는 달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상대를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며 "10㎞를 40분 안에 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씨는 "시각장애인 선수보다는 동반주자가 기량이 좋아야 편하게 달릴 수 있다"며 "동반주자가 잘 달리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리기는 '운동' 그 이상…"소통 기회 많아졌으면"
이날 정씨와 조씨는 13㎞를 1시간4분 만에 달렸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구불거리는 남산은 달리기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코스로 통한다.
하지만 남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장애인들을 왕왕 볼 수 있다. 지팡이를 짚고 남산을 혼자 오르는 시각장애인들도 많다.
정씨는 "남산에는 차도 없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없어서 우리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코스'"라고 했다. 정씨가 토요일 아침마다 남산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이유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정씨와 조씨는 동호회 회원 약 50명과 함께 달리고 함께 식사하며 교류한다.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각장애인 러너들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씨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달리기를 비롯한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그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고 또 취미생활은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다.
조씨는 "전국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동호회 활동이든 정부 지원이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천적으로 눈이 좋지 않았다는 정씨는 12세 때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하지만 그는 1㎞를 4분 만에 돌파한다. 정상 시력을 가진 성인 남성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기자는 5분도 채 안 돼 이들을 놓쳐버리고 산 아래에서 쉬었다. 정씨는 입구부터 꼭대기까지를 왕복으로 달리고도 아쉬운지 한 번 더 달리기 시작했다.
정씨와 동반주자 조씨는 끈으로 서로의 팔을 묶고 달린다. 조씨는 정씨가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코스를 안내한다. 조씨는 "형님(정씨) 체력에 맞추려면 너무 힘들다"며 웃었다.지난 2일 '달리기'를 매개로 4년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을 만나 사연을 들었다.
 |
| 시각장애 마라토너 정운로(왼쪽), 가이드러너 조성수가 서울 종로구의 한 모임센터에서 뉴스1과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20살 차이 극복한 '달리기' 듀오…"믿음이 비결"
정씨와 조씨가 달리기로 인연을 맺은 지 만 4년이 훌쩍 넘었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정씨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살뜰히 챙긴다. 이들은 함께 4년을 달려온 비결로 "서로를 잘 믿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씨는 2016년 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들을 보게 되면서 동반주자 봉사를 시작했다. 조씨는 "그때 처음 만난 운로 형님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매주 남산에 왔다"고 했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봉사'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나온다"며 "나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니 성취감이 배가 되더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저 때문에 형님이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절 잘 믿어주셔서 이제는 편하게 뛴다"며 "형님 성격이 친근감 있으시고 저에게 잘해주시니까 4년 동안 한 것"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조씨가 "하지만 제가 주의하지 못해 형님이 넘어진 적이 있다"고 미안해하자 정씨는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며 조씨를 감쌌다.
정씨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유도선수 출신이다. 학창 시절부터 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한 덕분에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했다.
하지만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5년 만에 몸무게가 20㎏이나 불었다. 2000년 정씨는 다시 운동을 결심했다. 그가 택한 것은 달리기였다. 정씨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해보니 승부욕이 생기더라"고 했다.
처음에는 일반 마라톤 동호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VMK)라는 동호회를 결성했다. 조씨도 이곳 소속이다.
정씨는 "처음에는 달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상대를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며 "10㎞를 40분 안에 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씨는 "시각장애인 선수보다는 동반주자가 기량이 좋아야 편하게 달릴 수 있다"며 "동반주자가 잘 달리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달리기는 '운동' 그 이상…"소통 기회 많아졌으면"
이날 정씨와 조씨는 13㎞를 1시간4분 만에 달렸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구불거리는 남산은 달리기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코스로 통한다.
하지만 남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장애인들을 왕왕 볼 수 있다. 지팡이를 짚고 남산을 혼자 오르는 시각장애인들도 많다.
정씨는 "남산에는 차도 없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도 없어서 우리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코스'"라고 했다. 정씨가 토요일 아침마다 남산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이유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정씨와 조씨는 동호회 회원 약 50명과 함께 달리고 함께 식사하며 교류한다.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각장애인 러너들에게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씨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달리기를 비롯한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그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고 또 취미생활은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다.
조씨는 "전국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동호회 활동이든 정부 지원이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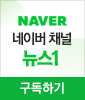










![최준희, 母 최진실 쏙 빼닮은 물오른 미모…점점 더 예뻐지네 [N샷]](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20/6607924/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뉴진스 다니엘, 소파 위 도발 눈빛...탄탄 복근까지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16/6599923/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