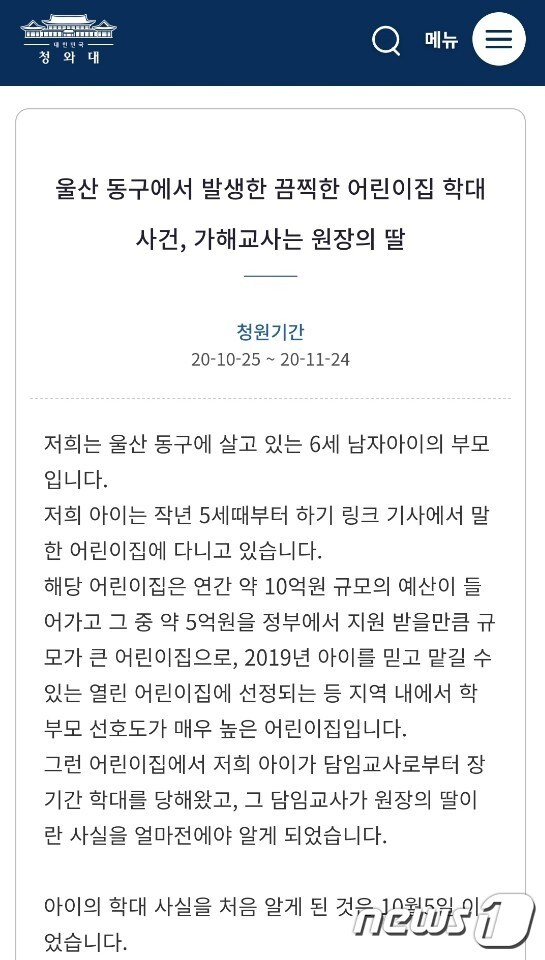 |
| 25일 청와대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 일부분(청와대게시판 캡쳐)© 뉴스1 |
경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울산 동구 한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어린이집 원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피해아동(6세)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담임 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에 밥을 5~6 숟가락씩 억지로 먹였다.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양쪽 발목을 밟는데다 책상 모서리에 아이 머리를 박고 손가락을 입에 집어 넣어 토하게 했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글을 올렸다.
또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입에 있는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보내주지 않고 아이는 발을 동동거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옷에 쉬를 하게 된 경우도 있고, 교실 밖으로 쫓아내 다 먹을 때까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후 수업시간에도 아이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면 아이가 더 크게 울고,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반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며 "아이가 끌려나간 복도는 CCTV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다. 그 곳에서 아이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아이가 또래 아이들 보다 작고 약하고,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해왔기에 식사량도 작고 편식도 심하다.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것은 입학 때부터 '아이가 원할 시 식사정리를 해 줄 것'을 매번 부탁했는데 가해교사는 아이의 식습관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식습관 개선을 빌미로 끔찍한 학대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CCTV확인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당시 원장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영상을 보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CCTV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CCTV확인결과 아이가 알려준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아이가 말한 것 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악랄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차마 해서는 안되는 학대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나도 잔혹한 장면들이 이어져 CCTV를 보던 아이 엄마는 실신할 지경에 이르러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CCTV 열람실을 먼저 나갈 수 밖에 없었다. CCTV 분석이 끝나고,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한 학대 정황도 추가 확인 돼 해당 부모들을 경찰서로 불러 CCTV를 같이 확인하고 본 건의 피해자로 등록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A씨는 "가해교사가 원장의 딸이라는 사실과 작년에도 다른 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며 "현재 관할구청 전수조사 내용에서 작년에도 저희 아이에게 학대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됐고 다음 주부터 작년 반 아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우리 아이에게 학대를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는 현재도 본 원의 5세반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알수 있는 CCTV영상이 확보되지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는 현재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혼자 베란다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러 가지 못하고 엄마의 살결이 닿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폭력성도 심해져 자신이 당한 모습과 같이 동생과 장난감 등으로 다툴 땐 동생을 눕히고 자신이 당한 모습과 같이 허벅지를 밟는다"고 아이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같은 반 친구 중 먼저 퇴소한 친구 중 어린이집을 먼저 퇴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는 화내는 사람이 없어 좋아', '밥 남겨도 혼내지 않아서 좋아' 라고 표현한다"며 "모든 피해 아동들이 하루 속히 심리치료를 받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syw0717@news1.kr













![뉴진스 다니엘, 소파 위 도발 눈빛...탄탄 복근까지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16/6599923/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