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후보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살장이 8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기호 1번을 의미하는 엄지 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0.4.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총선 불출마라는 피 한방울의 헌혈이었으면 충분하다"며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그날밤 나눈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임 전 실장이 기억하기 바란다"고 정치에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임 전 실장은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에 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선대위원장들보다 더 바쁜 전국적 지원유세를 통해 존재감을 보인 바 있다.
박 전 대변인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의 피 한방울'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는 그가 말한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는 것은 '총선불출마'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정치의 영역은 넓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임 전 실장에게도 요청을 드린다"면서 "민간 영역에서의 통일운동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다운 비전이지만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남북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라고 했다.
박 전 대변인은 "그날 밤 그(임 전 실장)와 나눈 대화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던 나로서는 정계 은퇴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권 정치를 떠난다'는 말이 참 의아하게 들렸다"며 임 전 실장과 과거 나눈 대화를 복기했다. 박 전 대변인이 언급한 그날 밤은 지난해 10월30일로, 임 전 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 약 보름여 전이다.박 전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박 전 대변인과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을 위해 부산에 내려갔고, 밤새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총선 승리가 관건이라는 데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변인은 "그날 밤 이런저런 이야기 도중, 내가 불쑥 그에게 '실장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임 전 실장에게 총선 불출마를 권유한 두가지 이유로 당시 정치권에서 일었던 '586 용퇴론'과 '청와대 참모진의 과도한 총선 출마 행렬'을 들었다고 한다. 임 전 실장은 대표적인 '586' 정치인인 동시에 청와대 참모라는 점에서다. 당시 임 전 실장은 서울 종로 출마설 한가운데 있었다.
박 전 대변인은 당시 임 전 실장에게 "실장님은 이 두 가지 프레임의 맨 앞에 서 있다"며 "586과 청와대 참모들이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그 문을 열어줄 역할이 책임처럼 주어져 있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불출마 권유를 듣고는 "형! 고맙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게 있는데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반응했다는 것. 박 전 대변인은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난 후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있었다"며 "그의 결단으로 586도 청와대 참모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그들의 길을 갈 수 있었고, 21대 국회에 19명의 청와대 참모들이 국회의원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변인은 "임 전 실장의 (총선)공로를 주장하는게 결코 아니다"라면서 "결승점에서도 반환점이 어디였는지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임 전 실장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다. 또한 "종로에서 당선된다면 여당의 차기 대권후보군에 진입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불출마선언은 신선하기도 했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예상하기에 충분했다"고도 덧붙였다.
seeit@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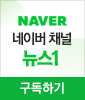










!['눈물의 여왕' 종방연, 한 번 더 연다…"포상휴가는 종영 후 논의 예정" [공식]](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23/6611710/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