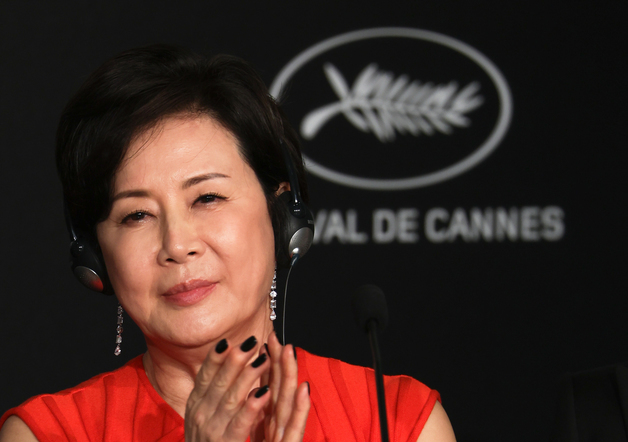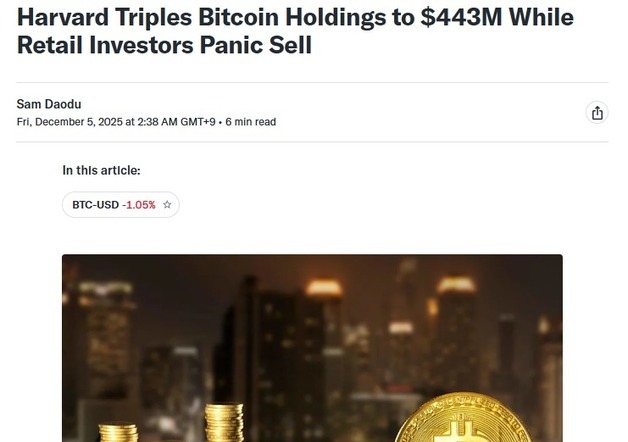'보이스피싱 은행 배상' 파격안…협의했다는 금융위, 현장선 "일방적 추진"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이르면 올해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정부가 해야할 일을 은행이" 반발 조짐…'탁상 정책' 비판도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피해 예방 취지는 분명하지만 내용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금융권의 반발이다. 정부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금융사에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방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이 피해액을 배상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범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상황에서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력을 가진 금융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50대 50으로 나눠 배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은행이 1순위로 피해 배상 책임을 지고, 통신사가 2순위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금융권의 수용 여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정책이지만, 전 사회적 문제로 번진 보이스피싱 피해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금융사가 부담한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금융권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정부, 구체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라며 "수사기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은행에 전가하고, 나아가 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토로했다.
'탁상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보이스피싱 담당자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추정돼 고객에게 연락을 해도 이미 범죄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우가 많아 '내가 책임질 테니 송금해달라'는 반응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직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2~3시간씩 설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소비자의 '무과실'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지, 금융사 외 통신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재정 여력이 취약한 2금융권에도 배상 책임을 부과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사와의 협의가 선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논의는 어느 정도 시작해둔 상황이며 은행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은행권은 '사전 교감 없는 일방 추진'이라는 분위기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배상 한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정책의 타당성부터 논의해야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금융권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사들이 모여 충분한 의견을 거친 후 제도를 구체화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