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1. |
지난해 말 중국 본토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바로 후강퉁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앞다퉈 자신들이 후강퉁의 강자라며 고객몰이에 나섰었다.
뚜껑을 열어보자 승자는 삼성증권이었다. 후강퉁 개장 한 달 동안 국내에서 후강퉁에 투자된 거래의 절반이 넘는 58%를 삼성증권이 도맡았다. 삼성증권이 가지고 있던 공중증(恐中症·중국을 무서워 하는 병)이 깨지는 순간 같았다.삼성증권은 공중증에 걸릴만 한 이유가 있다. 섣부른 대륙진출로 수장이 교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1년 홍콩에 지사를 설립하고 대륙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009년에 박준현 사장 재임 시절에는 자본금을 1억달러로 증자하고 현지 인력규모를 100여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실적으로 성공을 증명하지 못했다. 삼성증권 홍콩법인은 2010회계연도에 홍콩법인에서만 4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사업은 철수했다.홍콩시장의 실패는 박 사장의 퇴진으로 이어졌다. 박 전 사장은 랩어카운트의 성공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중국의 실패로 유종지미가 되지 못했다.
박 사장 빈자리를 메운 사람이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이다. 윤 사장은 박 전 사장이 증권에서 운용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삼성경제연구소로 물러가자 그 자리를 채웠다. 이후 지난해 말 인사로 삼성자산운용에서 삼성증권으로 옮기면서 경영 전면에 배치됐다.
윤 사장은 다른 메뉴로 중국 공정에 나섰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후강퉁에 대한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국내 후강퉁 시장 점유율 60%", "후강퉁 자산 1조원 돌파", "해외 주식 중개수수료 25배 성장" 등 후강퉁을 내세워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중국 증시지수의 변덕적 폭락 앞에 이번에도 삼성증권은 시련을 겪게 됐다. 최근 삼성증권은 후강퉁 비중축소를 고객에게 권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저가매수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중국 진출시도는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보는 사안이다. 삼성증권은 재계 서열1위 그룹에 속한 증권사다. 그만큼 중국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면 돈이든 사람이든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곳도 삼성증권이다. 그것의 실패는 국내 다른 증권사의 자신감도 앗아가기 충분하다.
삼성증권은 전통적으로 자산관리 영업을 주력으로 펼쳐왔다. 자산규모도 웬만한 은행만 하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현실에 맞게 적응한 것일게다. 기준금리 1%시대에 보다 나은 수익률을 얻기위해 중국은 안할 수 없는 사업지역이다. 그렇지만 이번 폭락을 계기로 중국증시는 변덕이 심하고 살아남는 것이 간단하지 않음을 또한번 보여줬다. 그런맥락에서 중국증시는 급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다. 경영자입장에서는 급히 가고 싶겠지만 조급함은 중국증시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kh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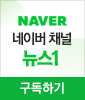












![뉴진스 다니엘, 소파 위 도발 눈빛...탄탄 복근까지 [N화보]](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4/16/6599923/no_water.jpg/dims/resize/276/crop/276x184/thumbnail/138x92!/optimize)






